조주청의 사랑방 이야기 (95)<백송(白松)>
천석꾼 부자 백 진사…폐병 걸린 7대 독자와 시들어가는 백송 걱정에 한숨
그해 봄, 아들이 색주집을 드나들고
백송 가지마다 솔방울 달리는데…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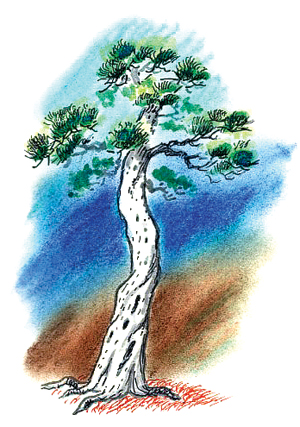
백 진사는 새벽닭이 울 때까지 이 걱정 저 걱정으로 잠을 못 이뤘다.
그러다가 홑적삼만 걸친 채 밖으로 나와 구름 걷힌 하늘에
오랜만에 두둥실 떠오른 만월(보름달)을 쳐다보고 간청했다.
“천지신명이시여, 소인을 데려가고 두 목숨을 살려주소서.”
천석꾼 부자 백 진사가 제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두 생명은 무엇인가?
하나는 7대 독자인 아들 윤석이고, 다른 하나는 백송(白松)이다.
열일곱살 윤석이는 폐병이 깊어 기침이 끊이질 않고,
밤이면 요강에 검붉은 피를 토한다.
파리한 얼굴에 두 눈은 쑥 들어가고 광대뼈는 솟아올랐다.
키는 삐죽하게 컸지만 피골이 상접했다.
아들이 둘만 있어도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련만 윤석이는 7대 독자,
대가 끊어질 판이다.
팔도강산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 탕제를 달여 먹여도 백약이 무효다.
개소주에 진국을 시도 때도 없이 먹여도 윤석이는 바짝바짝 말라만 간다.
그렇게 열심히 하던 글공부도 접었다.
과거가 대수인가, 사람이 살아야지.
뒤뜰 별당 앞에 우뚝 선 백송도 걱정거리다.
8대 조부께서 청나라 사신으로 갔다가
화분에 심은 흰 소나무를 가져와 손수 심은 것이다.
이후 매년 식재한 삼월 닷샛날에는 백송 앞에 떡 벌어진 생일상을 차렸다.
줄기가 새하얀 백송은 참으로 귀한 소나무인데,
이름값을 하느라 좀체 솔씨가 발아하지 않아
손을 퍼트리지 않으니 더더욱 희귀하다.
8대 조부는 문중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백송을 호적에 올렸다.
그런데 몇 년째 백송의 가지가 시들시들 마르고
봄에 솟아나는 솔순이 빈약하기 그지없다.
막걸리를 붓고 쇠고기를 썩혀 백송 옆에 묻어두고 별별 거름을
다 써도 백송은 갈수록 생기를 잃어간다.
그해 봄, 수심이 가득 찼던 백 진사의 얼굴이 펴지기 시작했다.
백송 가지마다 솔방울이 바글바글 달리는 것이다.
어디 그뿐인가. 윤석이가 저잣거리 색주집을 드나들며
여색(女色)에 탐닉했다는 소식도 들었다. 백 진사는 무릎을 탁 쳤다.
“그래, 봄이 왔어! 만물이 소생하는 봄!
백송도 살아나고 우리 윤석이도 춘색에 물들었어.”
집사가 소문을 수시로 주워와 백 진사에게 귀띔했다.
윤석이가 빠진 색시는 한둘이 아니었다.
이 색주집, 저 기생집에서 이 색시, 저 기생 닥치는 대로 치마를 벗겼다.
어느 날 백 진사 사랑방에 노스님이 찾아왔다.
백 진사는 곡차를 주고받으며 이런 상황을
노스님에게 들뜬 목소리로 전했다.
차분히 듣고 난 노스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.
“아드님과 백송이 봄기운을 맞은 게 아니라 가을서리를 맞은 것입니다.
소나무가 솔방울을 많이 맺는 것은 자신이 죽기 전에
자손을 퍼뜨리려는 자연의 섭리입니다.
마찬가지로 폐병이 깊은 아드님이 여색에 몰두하는 것도
제 생명이 꺼지며 자손을 남기려는 본능입니다.”
백 진사는 술잔을 연거푸 비우더니 고개를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.
“내가 생전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!”
노스님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.
“그 혹독한 춘궁기에 이웃들은 초근목피로 연명할 때
진사어른은 백송에 진수성찬 생일상을 차려주고,
대궐 같은 집에 아드님 방이 있는데도 뒤뜰 백송 옆에 호화 별당을 또 지었지요.”
“여봐라~.”
백 진사의 고함에 집사가 달려왔다.
“곳간을 열어젖히고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집으로 오라 해라.”
그러나 너무 늦었다. 폭우에 천둥번개가 치던 밤,
백송은 쓰러지고 피를 한 요강 토한 7대 독자 윤석이도 이승을 떠나고 말았다.
이듬해 정월 대보름,
시름에 젖은 백 진사네 집은 그야말로 적막강산이다.
그때, 윤석이가 죽고 나자 말 없이 백 진사네 집을 나갔던
열아홉살 찬모가 불알 달린 갓난아이를 안고 돌아왔다.
봄볕이 완연할 때 뒤뜰 남향받이 담 앞에 백송 한포기가 앙증맞게 올라왔다.
주야장천 누워 있던 백 진사도 기지개를 켰다.
'야화(조주청의 사랑방이야기)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조주청의 사랑방 이야기 (97) <떠돌이 노름꾼 (0) | 2021.10.06 |
|---|---|
| 조주청의 사랑방이야기 96선친의 일기장 (0) | 2021.10.06 |
| 조주청의 사랑방 이야기 (94)<황토 개울물> (0) | 2021.10.05 |
| 조주청의 사랑방 이야기 (93) <돌아야 돈이다> (0) | 2021.10.05 |
| 조주청의 사랑방 이야기 (92)<겁탈> (0) | 2021.10.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