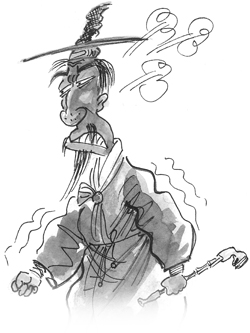조주청의 사랑방 이야기(132) 노 첨지 재취로 팔려간 열일곱 막실이 남편이 이승 하직할 날만 기다리는데… 막실어미가 폐병에 걸려 노 첨지로부터 장리쌀을 빌려다가 병을 고쳤지만 온 식구들 목줄이 걸려 있는 논 세마지기, 밭 두마지기는 노 첨지에게 넘어가고 말았다. 늙은 노 첨지가 논 세마지기, 밭 두마지기를 돌려주고 꽃다운 열일곱 막실이를 사와서 재취로 들여놓았다. 흑단 머리에 백옥 같은 살결, 또렷한 이목구비에 아직도 솜털이 가시지 않은 꿈 많은 이팔청춘 막실이. 줄줄이 어린 동생들 배 굶기지 않겠다고 제 어미 눈물을 닦아주고 제 발로 노 첨지에게 간 것이다. 노 첨지네 식구들은 단출하다. 막실이와 동갑내기인 노 첨지의 무남독녀와 우람한 덩치의 총각 머슴이 가족의 전부다. 낯선 집에 안주인으로 들어온 ..